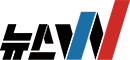'금융라떼'는 2000년대 전후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흐름을 키워드 중심으로 알기쉽게 정리해주는 섹션입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업종 취업을 계획 중인 독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는 은행 등에 대한 과거사를 알고 거래한다면 나름 쏠쏠한 재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섹션의 특성 상 다소 '꼰대'스런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외국계 은행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또 다시 '국부유출'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 은행이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각 500억원, 14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거죠.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에도 2000억원 가량의 중간배당을 시행했는데, 배당성향이 무려 71.31%에 달합니다. 한 해 벌어들은 순수익의 70% 이상을 본국에 송금한 셈이죠.
한국씨티은행 역시 배당성향이 50% 수준인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주환원'을 외치며 꾸준히 올려온 배당성향이 30%에도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배당이 많다고 마냥 비난받은 일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 제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 크게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죠.
실제 미국과 일본기업들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각각 70%, 50%대를 웃도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일본 역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계은행이 툭하면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이는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배당금의 100%가 각각 스탠다드차타드(SC) 북동아시아법인과 미국 씨티그룹에 보내진다는 점에서죠. 결국 이들 은행의 배당성향은 전적으로 본사의 배당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배당성향은 '투자금 회수'로 비춰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최근 10여년동안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꾸준히 매각설에 휩싸였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이들 은행은 엑시트(Exit) 논란 때마다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해왔지만, 결국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한국 진출 17년만에 소비자금융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SC제일은행은 여전히 한국 철수설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은행이 철수설에 휘말리는 이유는 고배당 이슈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계은행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은행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죠.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다국적 은행이지만, 국내에서만큼은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규모에서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물론 지방은행에까지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계은행의 경쟁열위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04년 한미은행과의 M&A(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한 은행이고, 스탠다드차타드는 2005년 제일은행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씨티그룹의 경우 당시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스탠다드차타드가 인수한 제일은행은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5대 시중은행(조상제한서)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까지 경쟁에 합류하면서, 당시에는 외국계은행이 국내시장을 '접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외국계은행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이렉트 예적금' 등을 선보이며 공격경영에 나섰던 HSBC는 지난 2013년 한국 철수를 결정했고, 9년만에 한국씨티은행도 HSBC의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이 기간 덩치를 크게 확장해온 5대은행과 비교하면 오히려 외국계은행의 사세는 쪼그라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외국계은행들의 중도 이탈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외국계은행의 무덤'이라는 인식까지 생겼고,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즉 '관치금융'이 주된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은행권의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계좌 개설·유지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각종 수수료마저 '무료'로 인식되는 시장에서 비용효율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거죠.
물론 외국계은행들도 WM(자산관리) 부문 강화 등 돌파구 마련에 애를 써왔지만, 이미 5대 은행 경쟁구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0여년 전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이 우간다 은행의 경쟁력에도 뒤쳐진다는 조사가 나와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간다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계좌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한국이 일부 특정계층만 계좌를 갖고 있는 후진국보다 뒤쳐진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자이익에 편중된 은행 수익구조와 함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며 은행권의 '변화'를 연일 압박하고 있죠.
이른바 '뷰카(Volatile·Uncertainty·Complexity·Ambiguity)'로 대변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 하에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은행마저 혀를 내두르는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후진적'이라고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w]
- [금융라떼] NGO와 경쟁하는 시중은행?
- [금융라떼] 하나금융 '충성문화' 원인은 멜팅팟?
- [금융라떼] '금융계의 삼성'을 아시나요?
- [금융라떼] 우리은행에 소환된 '검투사'의 추억?
- [금융라떼] 은행원 채용 특혜가 재량이라고?
- [금융라떼] '은행원'인 게 부끄럽다고?
- [금융라떼] 갑을(甲乙) 뒤바뀐 은행-기자 관계?
- [금융라떼] 고객에게 '진심'인 금융그룹은 어디?
- [금융라떼] 대통령도 없는 연령 제한, 금융지주는 왜?
- [금융라떼] '호칭 파괴'의 원조는 하나은행 JT?
- [금융라떼] 국책은행, 신이 버린 금융공기업?
- [금융라떼] '리딩금융'이 뭐길래?
- [금융라떼] 우리은행은 왜 '워리은행'이 됐을까?
- [금융라떼] 은행 공공성 발원, '조상제한서'를 아시나요?
- [금융라떼] 하나금융, 여론조사업체와도 해괴한 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