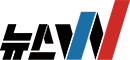'금융라떼'는 2000년대 전후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흐름을 키워드 중심으로 알기쉽게 정리해주는 섹션입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업종 취업을 계획 중인 독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는 은행 등에 대한 과거사를 알고 거래한다면 나름 쏠쏠한 재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섹션의 특성 상 다소 '꼰대'스런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1년 전후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물론 자산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비단 무디스만의 시각은 아닌듯 합니다. 가뜩이나 임계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연 2% 수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은행들로서는 대출 자산의 증가는 커녕 부실 자산 급증을 걱정해야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미뤄짐작할 수 있듯 부동산 시장의 거듭된 침체는 건설업황에 직격탄이 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전이되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전방위적 PF 대출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의 재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대규모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들립니다. 특히 이런 목소리는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 불거져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물론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의 경우 풍부한 저원가성 수신 덕에 PF 부실에서는 한발 비켜서 있습니다. 덕분에 2011년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각 은행들마다 저축은행 계열사를 하나씩 늘리는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죠. 당시에는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은 모양새였지만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일부 도움이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무디스의 분석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환대출 플랫폼'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따른 경쟁격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확대'가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이들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제고를 내세우는 금융당국, 즉 정부 주도 하에 발생한 외생 변수라는 점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시시각각 대환 금액이 공개될 정도로 이슈몰이에 성공했고, 시중은행들은 NGO 단체인냥 하루가 멀다하고 사회공헌 활동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을 향한 '사회적 책임' 압박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은행권의 실적잔치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공공재', '독과점', '종노릇', '돈잔치', '갑질' 발언 등 지난 한해동안 이어졌던 '은행 때리기'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죠. 은행업의 경우 정부 인가가 필요한 라이센스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치(官治)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인식처럼 국내은행들은 과거 '금융기관'으로 불릴 정도로 공공재로서 역할이 강조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국내외 자금흐름의 핵심 역할을 했으니 공기업처럼 인식됐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체제를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 은행권은 국책은행과 지방은행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경쟁구도에 합류하면서 무려 20여개에 달하는 은행이 난립(?)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추가로 제4 인터넷전문은행 등장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으로 인식됐던 과거처럼 대형 은행에 뚜렷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방은행과 중저신용 대출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목적에 따른 한도 규정은 있지만, 서비스 및 사업영역에서 별다른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시중은행의 경우 과거 IMF 외환위기 속에서 M&A(인수합병)를 통해 덩치를 크게 키웠고,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4대 시중은행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겠죠. 과점 논란이 불거진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판단대로 과점 완화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금융업 특히 은행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히려 국내외를 막론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처럼 과당경쟁이 불러온 시스템 위기는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은행들의 비이자 수익확대 경쟁이 맞물려 촉발된 사태죠.
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6년, 새로운 정부가 6차례나 등장했지만 M&A 과정에서의 피인수 부실은행에 대한 혈세 지원은 여전히 시중은행들로서는 '주홍글씨'처럼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우리금융그룹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1.24%)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은행을 끝으로 정부에 '빚'이 있는 은행은 이제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100% 민영화를 완성했다'고 자축했지만, 금융당국 수장 출신(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이끌고 있는 금융사의 이런 언급이 그저 공허한 바람으로 다가오는 것은 저만의 해석일까요. [뉴스w]
- [금융라떼] 하나금융 '충성문화' 원인은 멜팅팟?
- [금융라떼] '금융계의 삼성'을 아시나요?
- [금융라떼] 우리은행에 소환된 '검투사'의 추억?
- [금융라떼] 은행원 채용 특혜가 재량이라고?
- [금융라떼] '은행원'인 게 부끄럽다고?
- [금융라떼] 갑을(甲乙) 뒤바뀐 은행-기자 관계?
- [금융라떼] 고객에게 '진심'인 금융그룹은 어디?
- [금융라떼] 대통령도 없는 연령 제한, 금융지주는 왜?
- [금융라떼] '호칭 파괴'의 원조는 하나은행 JT?
- [금융라떼] 국책은행, 신이 버린 금융공기업?
- [금융라떼] '리딩금융'이 뭐길래?
- [금융라떼] 우리은행은 왜 '워리은행'이 됐을까?
- [금융라떼] 은행 공공성 발원, '조상제한서'를 아시나요?
- [금융라떼] 한국은 글로벌은행의 무덤?
- [금융라떼] 하나금융, 여론조사업체와도 해괴한 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