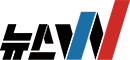| 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

#.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가입 보험사에 진단비(보험금)를 청구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조직검사결과지상 암세포가 아닌 비정형세포라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A씨)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자료가 방대한 분량의 약관이다. 보험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약관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설사 보험약관에 명시된 질병이 생겼더라도 약관 내용에 따라 진단비 지급이 거절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약관을 모두 이해하고 가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2016년 영국 BBC방송은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 33개의 이용약관을 모두 읽는 장면을 생중계한 적이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카이프, 지메일, 유튜브 등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앱을 포함한 33개의 약관을 모두 읽는데 31시간49분11초 걸렸다. 이는 신약성서를 읽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다. AFP통신은 앱의 이용약관을 모두 합하면 26만자로 A4용지 900쪽이 넘는다고 했다.
보험약관과 비교하면 앱약관은 애교에 불과하다. 보험상품 하나를 가입해야 하는데 읽어야 할 약관은 폰트9 크기로 최소 200~300쪽 분량이다. 그나마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따라 개선된 것이 이 정도다. 만약 보험상품 2~3개를 가입한다면 400~900쪽 분량의 약관을 봐야 한다.
물론 읽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약관에 있는 용어를 해석하는 범위는 또 다른 이야기다.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는 "변호사들조차도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며 "약관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약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보험 약관 전체를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법인 만큼 보험약관 대신 보험증권을 활용해보자.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을 기록한 문서다. 미리 작성된 계약서인만큼 보험사엔 유리하고 소비자에겐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보험 약관의 95%가량은 내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 상품별로 보험료와 보장내역은 다를 수 있지만 약관의 95%는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다. 즉 보험사가 현 가입자든, 예비가입자든 상관없이 미리 정해 만든 계약서가 약관이라면 보험사와 계약자간 일대일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험증권이다.
예컨대 B씨가 암 진단비 5000만원, 암 입원 일당 10만원, 암 수술비 2000만짜리 보험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C씨는 똑같은 보험상품이지만 암 진단비 3000만원, 암 입원 일당 20만원, 암 수술비 3000만원으로 수정해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내역은 물론 보험료도 달라진다. 또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등으로 변경하는 등 성별이나 개인에 따라 암의 성격도 바꿔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똑같은 암에 걸렸다고 해도 B씨와 C씨의 진단비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보험증권에는 이처럼 보험료와 각 질병,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장내용이 가입자 성향에 맞춰 더 쉽고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물론 약관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범위가 넓어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만약 보험사와 소송이 걸린다면 약관 대신 보험증권을 먼저 꺼내야 한다"면서 "보험증권을 토대로 법의 판결을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아쉬운 점은 보험증권을 보유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심지어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험증권이 없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면서 "수십년 전 가입한 사람이라면 재발급 받을 때 보험증권 내용이 일부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 가입했을 때 받은 보험증권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재판에서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시 A씨의 사례로 들어가보자. A씨는 어떻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됐을까. 방법은 유사암 진단비 청구다.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암은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유사암은 갑산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비정형 세포), 피부암 4가지 종류를 보장하는 특약 상품이다.
A씨는 처음에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일반암은 악성종양만 보장이 가능하기에 보험사 입장에선 진단비를 거절할 명분이 있다.
다행히 A씨는 유사암 특약에 가입한 상태. 그는 뒤늦게 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비정형세포도 경계성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고 다시 유사암 진단비로 수정 청구했다. 그 결과 유사암으로 판정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다.
호갱방지보험 닉네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김상훈 메타리치 보험대리점 본부장은 "A씨의 경우 보험증권을 통해 유사암이라는 특약 사항을 체크했기 때문에 진단비 청구가 가능했다"면서 "만약 이를 몰랐다면 끝내 진단비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처음부터 A씨가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진단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A씨에게 유사암 진단비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런 점이 금융소비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w]